《환상특급(The Twilight Zone)》 2019 리부트 시리즈의 “Point of Origin”은, 표면적으로는 SF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이민 정책과 정체성, 권력의 배제 논리를 정면으로 다룬 사회비판극이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타자화’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누가 “정상”이고 누가 “외부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SF적 설정으로 뼈아프게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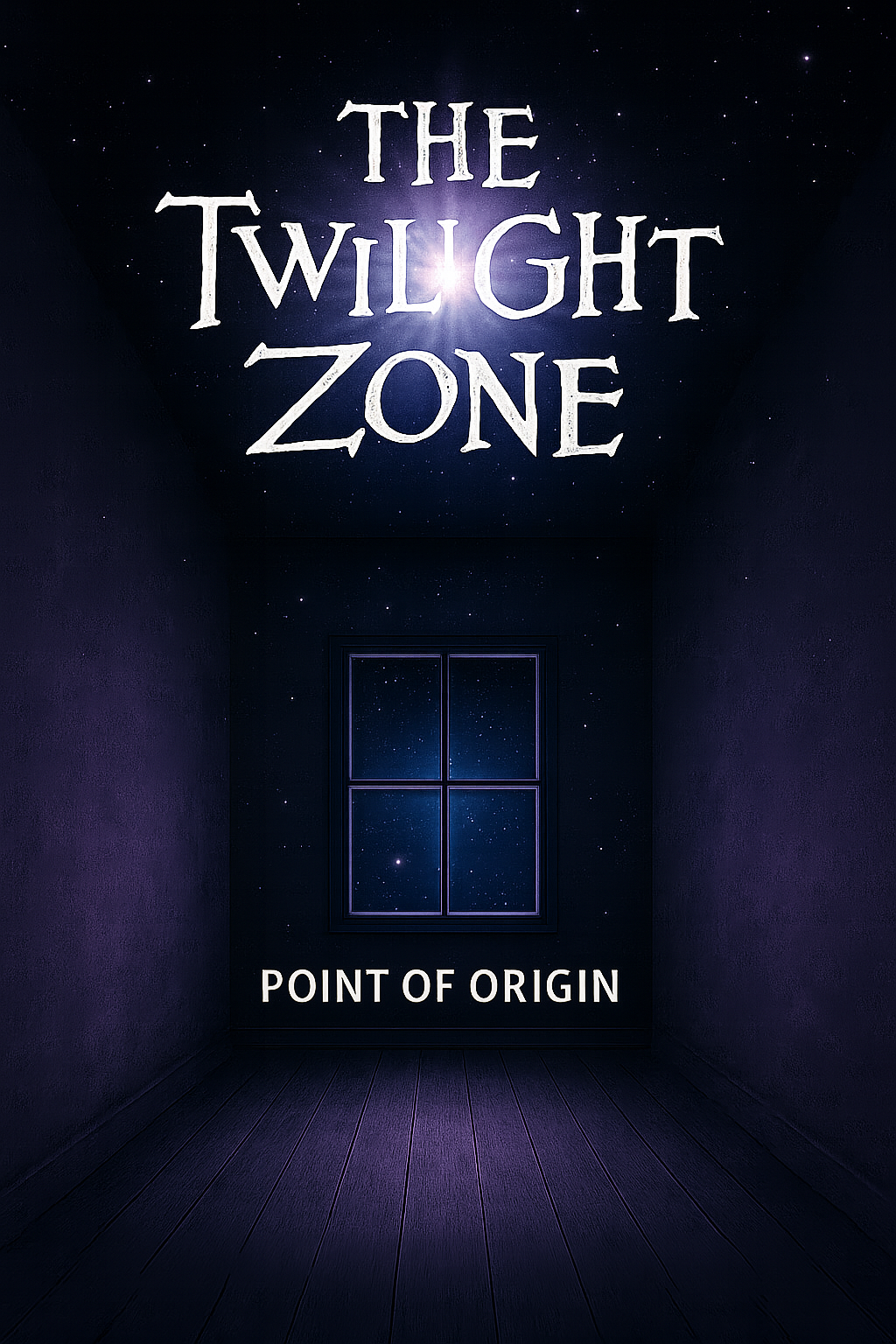
“너는 어디서 왔지?” – 정체성이라는 모호한 경계선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이브는 어디를 봐도 ‘미국인’이다. 외모, 말투, 생활 방식까지. 부유한 백인 가정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끌려간다. 이유는 묻지 말고, 설명은 없다. 여기서부터 감정이 끓기 시작한다. 이 드라마는 이민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그걸 숨긴다. 아주 뻔뻔하게, ‘우리 안에 있는 타자’를 폭로한다. 주인공이 “나도 미국인이에요!”라고 외칠수록, 보는 사람은 묘한 불쾌감을 느낀다. 진짜 미국인은 누구냐는 질문이 뒤통수를 친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단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현실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피부색은 어떤지,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검문’의 대상으로 만든다. 에피소드는 이런 현실을 너무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억지스럽고 과장된 설정이 아니라서 오히려 진짜 같다.
“우리가 너희를 받아준 거야” – 환대가 아니라 통제였다
작품 속에서 이브는 감시소로 끌려간다. 그곳은 겉보기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다. 사람들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갇혀 있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분류’된다. 여기서 정말 불쾌한 건, 관리자의 태도다. 그들은 이브에게 말한다. “네가 받은 모든 혜택은 우리가 허락해준 거야.” 환영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거다. 이 장면을 보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라는 말 뒤에 숨은 통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별. 이 에피소드가 무서운 이유는, 굳이 어떤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시스템이 가진 배제의 구조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SF 장르를 빌렸지만, 내용은 지독히 현실적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다. 괴물도, 외계인도 안 나온다. 나오는 건 오직 권력,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이름의 칼날뿐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 – ‘우리’라는 말의 폭력성
이브는 끝까지 저항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 들고,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따져 묻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그리고 판단이다. 그녀는 결국 “우리”의 테두리에서 밀려난다. 이 에피소드는 질문한다. “너는 정말 너 자신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허락한 정체성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미국에 사는 이방인들, 혹은 소수자들이 매일같이 체감하는 질문이다.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이브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겉으론 똑같아 보여도,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 심지어 집 안의 공기까지도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뿌리까지 흔드는 불안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려는 핵심이다. 이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지목당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게 분류되는 사람들. 그걸 멀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손쉽게 행해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Point of Origin”은 미국 이야기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현실이다. 어느 나라든, 누가 주류인지, 누가 바깥인지 정하려 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드라마는 말한다. 정체성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한다면, 그건 결국 권력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는 일이라고. 이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SF가 아니다. 약간은 설명이 부족하고, 구성도 헐겁다. 하지만 그 허술함마저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감정적으로 리얼’하다. 그래서 리뷰어라면 이 작품을 그냥 줄거리로만 넘기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불안과 불편한 진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